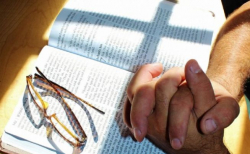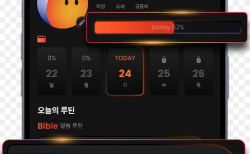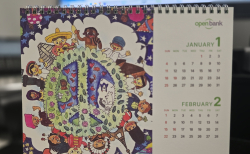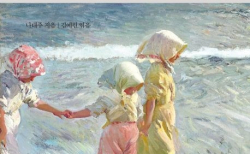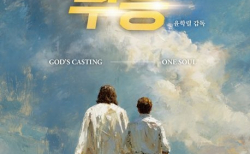[1] ChatGPT를 설교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보수주의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반응이 꽤 달라졌다. 활용해서 얻는 유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깨야 한다. 빨리 깨면 깰수록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렇다.
ChatGPT를 활용하면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적잖은 유익이 있다.
[2] 우선 설교문 준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양의 유익한 자료들을 분초 단위로 빨리 찾아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설교문 작성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주는 유익도 크다.
물론 Chat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와 한계들이 분명 있다. 한 편의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선 많은 땀과 수고와 열정이 필요하다. 우선 본문 정하는 일에서부터 본문을 읽고 분석하고 묵상해서 영양 만점의 핵심 메시지를 추출해야 한다.
[3] 본문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한 문장을 캐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얻어낸 하나의 원석을 가지고 연마해서 진귀한 보석이 되도록 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원고 작성의 과정’ 말이다. 그 과정에 설교자의 소중한 시간과 정성어린 땀과 열정과 기도가 요구된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한 편의 설교문이 완성된다. 그런데 그렇게 긴 고뇌와 진액을 짜는 과정 없이 AI를 통해 한 편의 설교문을 얻어냈다 생각해보라.
[4] 웬만큼의 양심 있는 설교자라면 그런 방식에 의해 초고속으로 만들어진 설교 원고를 죄스럽게 여기거나 꺼리는 게 정상이다. 그렇디고 AI 사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편의 설교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아무런 자료나 정보를 참조하지 않는 설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설교자 대부분이 주석이나 설교집을 참조하고 있다. 설교자가 참조하고 도움받는다고 하는 ‘주석’이나 ‘책’이나 ‘설교집’은 어떤 것들인가?
[5] 저자가 아니라면 모든 자료들이 다 남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처럼 남이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자료들은 가책 없이 잘 활용하면서도, 정작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한 자료들 활용은 거부한다면 말이 되질 않는다.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범죄라는 생각을 가진 이가 많다. 당연히 그대로 사용하는 건 ‘죄’요 ‘반칙’이다. 실제로 활용해 보면,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불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6] 그만큼 부실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은 짜깁기 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 다른 이들의 설교집을 참조하지 않는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 없이도 독창적이고 질적으로 구별되는 설교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기존에 나와 있는 AI 몇 개를 후배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 ‘ChatGPT’와 ‘Perplexity’와 ‘Google Gemini’, 이 세 가지이다.
[7] 세 가지 프로그램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에 각기 장점을 살려서 골고루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설교할 본문이 정해지면, 우선 그 본문의 내용을 원어에 맞게 번역한다. ‘사역’(私譯, Private Translation) 말이다. 그 사역한 본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읽은 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다. 그다음엔 도움이 되는 주석들을 참조해서 해석상에 문제가 없는지, 혹 내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없는지를 살핀다.
[8] 그런 과정을 다 거친 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포인트의 핵심 메시지 한 문장'을 추출한다. 그뿐 아니라 성경 공부 교재까지 만들어놓는다. 언제 다시 그 본문을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공들여 본문을 연구한 김에 아예 '질문과 답이 포함된 성경 공부 교재'까지 작성해 놓는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AI를 사용하여 본문 연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9] 눅 17:11-19절에 나오는 ‘열 명의 한센씨 병 환자’에 관한 본문이었다. 이미 연구해서 성경공부 교재까지 PPT로 만들어놓은 상태이다. 본문을 연구하고 파악할 땐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AI를 잘 활용하는 비결로 늘 언급되는 게 있다면 ‘질문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
성경 본문 연구를 할 때도 질문을 잘 던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점이다.
[10] 질문 잘 던지는 게 실력이기 때문이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 본문을 보는 눈이 다르고, 파악력이 남다르다는 증거이다.
눅 17:11-19절 본문은 무지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제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이를 잘 보질 못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음에도 모두가 군소리 않고 믿음을 갖고 갔다는 점이다.
[11]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환자 한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아홉 명의 믿음과 감사를 표시한 한 사람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설교자들이 첫 번째 혼돈을 일으킨다. 다음은 한 사람과 아홉 명의 차이를 ‘감사의 차이’로 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 사람과 아홉 명의 근본적인 차이는 감사에 있지 않다.
[12] 그런 점들에 관해서 AI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론 내가 원하는 ‘최상의 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그런대로 유익한 정보는 얻을 수 있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결국은 본문을 파악하는 ‘남다른 실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이들과는 ‘차별화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AI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내용을 초고속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이 큰 장점임을 알고, 모두 잘 활용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