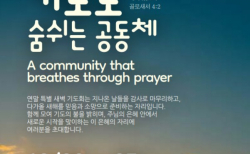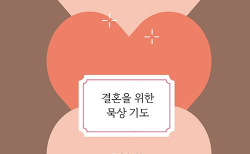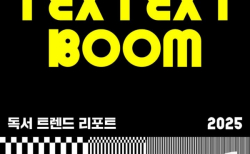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7-8절에는 오래전부터 성경 본문 비평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구절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흔히 "요한의 콤마(Comma Johanneum)"라 불리는 본문이다. 전통적 라틴어 불가타(Vulgata)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전해졌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짧은 문장은 삼위일체 교리를 단번에 요약하는 구절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경 원문 전통에서 매우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를 명확히 말하지만, 본문학적으로는 본래 요한이 기록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초기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물론 시내사본, 바티칸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 가장 신뢰받는 4세기 이전 그리스어 사본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가장 이른 흔적은 4세기 후반 이후 서방 교회의 일부 라틴 사본과 주석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학계 다수는 후대 라틴어 주석에서 출발해 필사과정에서 본문으로 삽입된 것으로 본다.
이 구절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에는 교회의 신학적 필요가 자리하고 있었다.
3~5세기 사이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아리우스파, 양태론 등)을 겪었다. 교회는 성경적 근거를 명료히 제시하려 했고, 요한일서 5장의 요한의 콤마로 "증언" 구절이 그 출발점으로 주목받았다.
필사자들이 성경 주석의 삼위일체적 해설을 여백에 적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사본에서는 이 주석이 아예 본문 속으로 삽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라틴어 불가타를 거쳐 서방 교회에서는 요한의 콤마가 성경 본문으로 자리잡게 된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거장 에라스무스(1466~1536)가 등장하면서 성경 본문 비평은 본격적으로 새 지평을 열었다. 그는 가능한 원문에 가까운 그리스어 본문으로 신약성경을 복원하려 했다. 1516년, 에라스무스는 그의 첫 번째 그리스어 신약성경(Novum Instrumentum omne)을 출판했으나, 요한의 콤마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가 참고한 초기 그리스어 사본에서는 이 구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누락은 가톨릭 신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했다. 결국 압력을 받던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사본에서 이 구절이 발견된다면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누군가 Codex Montfortianus라는 사본을 제시했다. 이 사본은 사실상 후대에 라틴어 불가타를 옮긴 사본으로 보이지만, 에라스무스는 원칙적으로 세 번째 판(1522년)부터 이 구절을 포함시켰다.
그의 이 판본이 후에 Textus Receptus(수용본문)의 기초가 되었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KJV)도 이를 따라 요한의 콤마를 본문에 수록하게 된다.
가톨릭은 중세 동안 불가타를 공인 성경으로 수용했고, 자연스럽게 요한의 콤마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본문 비평학의 발전을 수용하면서 현대 라틴어 성경(Nova Vulgata)에서는 요한의 콤마를 본문에서 제외하거나 각주로 처리하고 있다. 가톨릭 학자들도 이 구절이 본문적 권위는 약하나, 교리적 함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일부 KJV 유일주의자들은 요한의 콤마를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증거처럼 지나치게 절대화한다. 심지어 "이 구절을 뺀 모든 현대 성경은 이단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요한의 콤마가 없어도 성경 전체에서 충분히 확립된다. 이단 논쟁은 본문이 아니라 계시 전체의 종합적 해석 속에서 다뤄야 한다. 요한의 콤마 논쟁은 우리에게 본문 비평과 신학 해석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가르쳐준다.
첫째, 본문 비평은 신앙의 적이 아니다.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복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히 전달하려는 신실한 작업이다.
둘째, 교리는 본문보다 넓은 계시 전체의 조화에서 성립된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계시를 통해 분명히 확립된다. 단일 본문에 집착하여 교리의 유무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셋째, 지나친 문자주의를 경계하자. Textus Receptus나 KJV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존한 완전한 본문'이라 주장하는 것은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이 있다.
넷째, 겸손한 비평의 영성을 유지하자. 성경 본문 비평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경외와 신실함으로 행해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신비 앞에 무릎 꿇는 태도가 바른 본문 비평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요한의 콤마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본문 차이 이상의 신학적 교훈을 남긴다. 성경은 교리 수호를 위해 우리가 임의로 손댈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계시 속에서 조화롭게 이해해야 한다. 본문 비평은 신학적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한의 콤마가 있든 없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