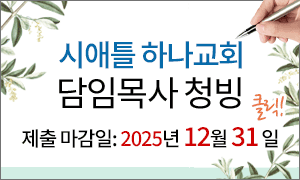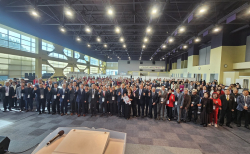전성민 교수(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장)가 유튜브 채널 '오늘의 신학공부'(대표 장민혁 전도사)와 최근 인터뷰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 교수는 "세계관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토대"라며 "한국 교계 안에 '대결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포용'으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식과 앎으로 삶이 변화되는 '지성의 제자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중심과 고지'를 추구할 것이 아닌 '주변과 변두리'로 나아가 '경계에서 다른 자들과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에서 성서언어와 구약학을 전공한 뒤 2009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가을부터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 신학자 최초로 영국 옥스퍼드에서 단독학술 연구서를 출간했다. 이는 '윤리와 성경 내러티브'(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라는 제목의 연구서로 옥스포드 신학 및 종교학 단행본 총서(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에서 출간했다.
# 한국교회에서 세계관의 역사
전 교수는 '한국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에 대해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로잔운동이 74년에 있었고, 80년대 한국사회는 민주화 운동으로 학생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던져줬다"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 안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과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세계관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를 넘어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통로"였다며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신학의 품을 넓히고,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의 책임을 고민하는 담론의 틀로 기독교 세계관이 논의됐다"라고 했다.
이어 "70·80·90년대를 지나가면서 관심사나 핵심들은 조금씩 변해갔지만, '신앙의 문제를 교회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라는 문제의식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큰 토대"였다며 "특별히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적일 수 있는, 혹은 적극적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주창했던 뿌리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한계와 틀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보수화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다. 내가 요새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풀고 씨름하는 주제"라고 했다.
# 편협해질 때의 위험
전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이원론의 극복'이다. 즉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말자.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영역에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문학, 기독교 음악, 기독교 경제 즉 기독교 식 ~무엇, 이런 식의 추구를 했던 때와 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물론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나누고 구분 짓다 보면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스스로 허무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기독교 세계관이 잘못하면 기독교를 게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문제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최근에 고민하는 것이, (교계 안에)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의 차이를 강조해서 대결의 정서를 고취시키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상호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를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될 경우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에서 가능한 대화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다"며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대결'이나 '충돌'이라는 개념이나 틀을 넘어서 기독교 세계관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관'"이라고 했다.
# 세계관적 성경 읽기
전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왜 읽는가? 변화를 받기 위해 읽는다. 어떤 변화인가? 세계관적 변화이다. 사람마다 기본적인 자신의 삶의 양식과 틀이 있다. 그런데 그 틀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지엽적인 행동이나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즉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전체적인 틀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관적 성경읽기'"라고 했다.
이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태양과 달을 얘기할 때, 달도 광명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달은 빛을 내지 않는다. 그저 '달이 빛을 낸다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말씀을 받았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도전을 주는 세계관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의 기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달이 빛을 낸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개념을 그냥 이용한다"며 "'달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야'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달이 빛을 내는 것 같지? 그런데 달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라고 '달을 신으로 생각했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달이 빛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을 사용하지만, 나는 이것을 '묘사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그 달이 신은 아니야'라고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바뀐 세계관을 '규범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라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묘사된, '사용된 세계관'인지, 어떤 것이 바꾸고 싶은 '규범적 세계관'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고 한다.
# 세계관과 한국교회의 과제
전 교수는 "세계관을 이야기했던 분들의 경우 '나의 지식과 앎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다. 당연히 새로운 것을 알면 변화되기는 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성의 제자도'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됐다"라며 "그러나 최근에 제임스 스미스 교수 같은 분들은 '실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아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 또는 욕망하는 것인가'를 얘기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욕망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혹은, 예전 표현으로 '고지'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그러나 욕망의 방향을 '중심이나 고지'가 아니라 '경계 넘어', '변두리'를 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를 향하는 마음, 또는 변두리라는 삶의 자리를 고민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다음 단계의 세계관적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그랬을 때 변두리를 넘어가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서 대결하게 되고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기게 된다. 경계 너머 타인을 만났을 때, 대결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공유된 가치 속에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