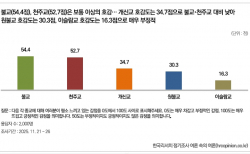한국교회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이단감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 및 사이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이단감별사를 자처하는 대부분이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종파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인물들로, 그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모 신학대학교에서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단감별사들이 규정한 이단 대부분은, 이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단감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들을 둘러싼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단감별사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구 위원과 신 위원간에 갈등을 빚은 것도,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겸비한 위원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사실 한국교회의 이단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과거의 행적과 정치적으로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잣대’에 의해서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한 폐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단감별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돈에 의해서 이단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돈을 주면 이단이 아니고, 안주면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안고 있는 목회자의 주변을 이단감별사들이 맴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일부 문제의 목회자 및 영성운동가들이 돈을 주고 이단의 면죄부를 받았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자 일부에서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국교회의 이단은 이미 드러난 통일교를 비롯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을 제외하고, 인간의 잣대로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단의 올무에 묶어 기성교회의 목회자와 영성운동가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기독교신문(http://gidoknews.kr/)
최근 모 신학대학교에서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단감별사들이 규정한 이단 대부분은, 이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단감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들을 둘러싼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단감별사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구 위원과 신 위원간에 갈등을 빚은 것도,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겸비한 위원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사실 한국교회의 이단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과거의 행적과 정치적으로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잣대’에 의해서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한 폐단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단감별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돈에 의해서 이단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돈을 주면 이단이 아니고, 안주면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안고 있는 목회자의 주변을 이단감별사들이 맴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일부 문제의 목회자 및 영성운동가들이 돈을 주고 이단의 면죄부를 받았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자 일부에서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국교회의 이단은 이미 드러난 통일교를 비롯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을 제외하고, 인간의 잣대로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단의 올무에 묶어 기성교회의 목회자와 영성운동가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기독교신문(http://gidoknews.kr/)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