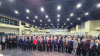“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직설가(直說家)이기보다 이야기를 통해 그 뜻을 전하신 분이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 등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정수(精髓)를 길어 올린다.
그런 예수님께서 소가 지는 멍에를 말씀하신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밭을 가는 소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자, 또한 그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소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다.
독립영화 ‘워낭소리’(감독 이충렬)를 스쳐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화가 한국 독립영화로는 최초로 25만 관객을 돌파하며 기적적 흥행을 이어가기 때문도 아니고, 주인과 소의 끈끈한 정이 가슴을 울리기 때문도 아니다. 말못하는 짐승의 희생이 오늘의 교회에 던지는 호소 때문이요, 차라리 인간에게 말이 없었으면 하고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40년. 뼈만 앙상한 소는 그렇게 평생을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고 주인의 손과 발이 돼 주었다. 소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소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주인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소를 끌고 나간다. 그래도 소는 아무 말이 없다(여기서 말은 ‘혀’의 말이 아닌 ‘마음’의 말이다). “이 소가 죽으면 따라서 죽겠다”는 할아버지의 말에서 소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난다.
지난 해 기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목회자의 언행불일치를 들었다. 단 위에서 목에 힘을 주며 ‘말’을 외치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다. 아예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는 말을 못하지만 할아버지는 소와 함께한 세월 동안 늘 소의 말을 들었다.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병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팔아야 했을 때, 소는 그 큰 눈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결국 할아버지는 소를 팔지 않았다. 소가 흘린 눈물의 ‘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소와 나란히 발을 맞추며 함께 뗄감을 지고 오는 장면에선 세상의 짐을 함께 나누어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있는 걸까. 교회는 하나님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 걸까.
이제 더 살지 못할 거라는 수의사의 말에 “안 그래”라며 고개를 저었던 할아버지는 이제 소를 땅에 묻은 후 홀로 나무 아래 앉아 소와 함께 갈았던 밭을 바라본다. 그의 손에는 워낭이 들려있다. ‘땡그랑 땡그랑’ 소는 죽어서도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직설가(直說家)이기보다 이야기를 통해 그 뜻을 전하신 분이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 등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정수(精髓)를 길어 올린다.
그런 예수님께서 소가 지는 멍에를 말씀하신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밭을 가는 소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자, 또한 그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소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다.
독립영화 ‘워낭소리’(감독 이충렬)를 스쳐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화가 한국 독립영화로는 최초로 25만 관객을 돌파하며 기적적 흥행을 이어가기 때문도 아니고, 주인과 소의 끈끈한 정이 가슴을 울리기 때문도 아니다. 말못하는 짐승의 희생이 오늘의 교회에 던지는 호소 때문이요, 차라리 인간에게 말이 없었으면 하고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
| ▲소와 나란히 발을 맞추며 함께 땔감을 지고 오는 장면에선 세상의 짐을 함께 나누어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
40년. 뼈만 앙상한 소는 그렇게 평생을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고 주인의 손과 발이 돼 주었다. 소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소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주인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소를 끌고 나간다. 그래도 소는 아무 말이 없다(여기서 말은 ‘혀’의 말이 아닌 ‘마음’의 말이다). “이 소가 죽으면 따라서 죽겠다”는 할아버지의 말에서 소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난다.
지난 해 기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목회자의 언행불일치를 들었다. 단 위에서 목에 힘을 주며 ‘말’을 외치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다. 아예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는 말을 못하지만 할아버지는 소와 함께한 세월 동안 늘 소의 말을 들었다.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병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팔아야 했을 때, 소는 그 큰 눈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결국 할아버지는 소를 팔지 않았다. 소가 흘린 눈물의 ‘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소와 나란히 발을 맞추며 함께 뗄감을 지고 오는 장면에선 세상의 짐을 함께 나누어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있는 걸까. 교회는 하나님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 걸까.
이제 더 살지 못할 거라는 수의사의 말에 “안 그래”라며 고개를 저었던 할아버지는 이제 소를 땅에 묻은 후 홀로 나무 아래 앉아 소와 함께 갈았던 밭을 바라본다. 그의 손에는 워낭이 들려있다. ‘땡그랑 땡그랑’ 소는 죽어서도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