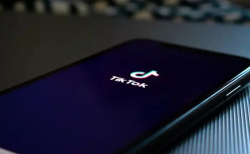매년 몇만 명의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민가방을 싸 들고 정든 고향을 떠나 미국이란 거대한 대륙에 정착하게 된다. 고국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삶의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서 미국이란 생소한 환경에 이식시키는 것을 이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삶의 현장을 완전하게 바꾸는 이 ‘이민’이란 복합적인 과정에서는 미리 예상치 못했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또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세월이 약이라고, 대체로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미국과 문화 차이를 덜 느끼고 사는 반면, 갓 이민 온 사람은 ‘이민 후유증’ 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보통이다. 한편, 미국에 살고 있는 횟수는 많아도 한국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 이민 온 이웃이 하루가 무섭게 미국화 된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삶의 터전과 생활습관, 언어와 문화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민은 삶의 괘도를 뒤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적응력을 요구한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적 이민 즉 몸과 생활 필수품은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심리적 즉 마음은 고향 땅에 머물도록 두고 왔을까? 가끔 한국의 정취가 물신 묻어 있는 사람이 더 ‘미국식’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동서의 문화권을 동시에 체험하는 미국 속의 한국인의 혼합정서가 때로는 우리 2세에게는 갈등과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문화와 한국문화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광대한 토픽이다. 언어, 즉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미국문화를 다 이해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것은 절대적인 일은 아니다. 물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는 필수적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부모가 의도치 않아도 자녀와 간격이 갈수록 넓어지는 경우를 보면, 언어뿐 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생각과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메리는 20대 후반기에 접어든 한국인 2세이다. “선생님, 엄마는 자꾸 한국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요. 물론 가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커서까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섞이냐고 짜증까지 내시니까 이제는 정말로 더 가기 싫어요,” 라고 흥분된 어조로 얘기한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다닌 교회를 멀리하는 것으로 인해 심각하게 죄의식에 시달릴 뿐 아니라 부모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도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갈등만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교회 엄마 친구가 저를 보기만 하면 말을 많이 하세요. ‘시집갈 때가 됐네, 남자친구가 있니, 직장은 어디 다니고, 이제 몇 살이니, 여자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적당한 사람 만나서 시집 빨리 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 참으로 황당 무개 하다고 푸념을 털어놓는 메리는 그런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남의 일까지도 내일같이 생각하는 한국인 따뜻하고, 대가족제도적인 포용정서로는 어쩌면 서로 걱정하고 참견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할 때 ‘it's none of your business,’(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팍 쏘아주는 것이 미국관습이다. 이런 미소한 문화 차이에서부터 우리 2세는 갈등을 느끼고 정확하게 옳은 답이 없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한다.
미국에서는 주말에 ‘Garage Sale’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사용하던 물건, 가구부터 부엌살림, 헌 옷, 아이가 쓰던 장난감까지 더 이상 쓰임새가 없는 것을 헐값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우리네 묵은 사고방식, 또는 선입견도 Garage Sale 할 수 있을까?
버리지 않고는 다시 채울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또 몸이 미국에 와 있듯이 마음도 미국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역사나 문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인권이나 신분, 사생활을(Privacy) 더 존중하는 이 나라에서 자라는 차세대와 생각차이를 좁히는 것부터 세대간 공존의 길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세월이 약이라고, 대체로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미국과 문화 차이를 덜 느끼고 사는 반면, 갓 이민 온 사람은 ‘이민 후유증’ 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보통이다. 한편, 미국에 살고 있는 횟수는 많아도 한국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 이민 온 이웃이 하루가 무섭게 미국화 된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삶의 터전과 생활습관, 언어와 문화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민은 삶의 괘도를 뒤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적응력을 요구한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적 이민 즉 몸과 생활 필수품은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심리적 즉 마음은 고향 땅에 머물도록 두고 왔을까? 가끔 한국의 정취가 물신 묻어 있는 사람이 더 ‘미국식’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동서의 문화권을 동시에 체험하는 미국 속의 한국인의 혼합정서가 때로는 우리 2세에게는 갈등과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문화와 한국문화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광대한 토픽이다. 언어, 즉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미국문화를 다 이해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것은 절대적인 일은 아니다. 물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는 필수적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부모가 의도치 않아도 자녀와 간격이 갈수록 넓어지는 경우를 보면, 언어뿐 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생각과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메리는 20대 후반기에 접어든 한국인 2세이다. “선생님, 엄마는 자꾸 한국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요. 물론 가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커서까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섞이냐고 짜증까지 내시니까 이제는 정말로 더 가기 싫어요,” 라고 흥분된 어조로 얘기한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다닌 교회를 멀리하는 것으로 인해 심각하게 죄의식에 시달릴 뿐 아니라 부모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도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갈등만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교회 엄마 친구가 저를 보기만 하면 말을 많이 하세요. ‘시집갈 때가 됐네, 남자친구가 있니, 직장은 어디 다니고, 이제 몇 살이니, 여자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적당한 사람 만나서 시집 빨리 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 참으로 황당 무개 하다고 푸념을 털어놓는 메리는 그런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남의 일까지도 내일같이 생각하는 한국인 따뜻하고, 대가족제도적인 포용정서로는 어쩌면 서로 걱정하고 참견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할 때 ‘it's none of your business,’(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팍 쏘아주는 것이 미국관습이다. 이런 미소한 문화 차이에서부터 우리 2세는 갈등을 느끼고 정확하게 옳은 답이 없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한다.
미국에서는 주말에 ‘Garage Sale’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사용하던 물건, 가구부터 부엌살림, 헌 옷, 아이가 쓰던 장난감까지 더 이상 쓰임새가 없는 것을 헐값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우리네 묵은 사고방식, 또는 선입견도 Garage Sale 할 수 있을까?
버리지 않고는 다시 채울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또 몸이 미국에 와 있듯이 마음도 미국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역사나 문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인권이나 신분, 사생활을(Privacy) 더 존중하는 이 나라에서 자라는 차세대와 생각차이를 좁히는 것부터 세대간 공존의 길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