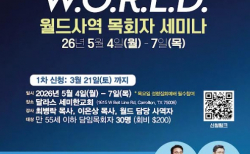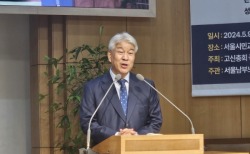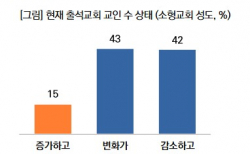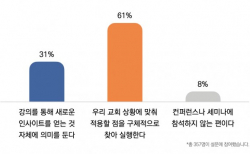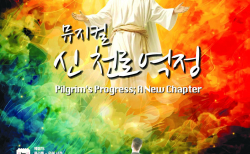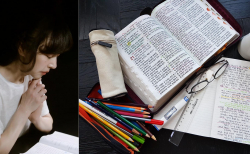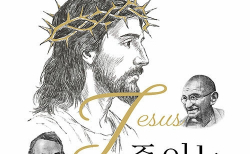17세기 초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하여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같은 신앙공동체로 성장하며 터전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18세기 초, 북미 식민지 사회는 개척지 발달, 영토 확장을 위한 크고 작은 전쟁, 노예제도 정착,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주의, 형식주의, 개인주의가 팽창되며 영적으로 침체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20-1750년 사이에 죠지 윗필드(George Whitefiled,1714-1770)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1703-1758)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부흥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 Movement)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종교적 활력을 되찾고 개인의 신앙 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 분야 외에도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미국 내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 교회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팽창되어 가면서 예전(Liturgy)에 대한 이슈로 교회 안에서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배적인 교단인 장로교 중 보수적인 성향의 스코틀렌드 -아일랜드 파와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뉴잉글랜드 파가 예배에서 찬양을 사용하는데 서로 갈등을 빛게 된 것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스코틀렌드 장로 교파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제네바 시편가(Genevan Psalte) 만을 예배에서 사용하도록 주장하였고 이에 반한 뉴잉글렌드파는 당시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이삭 왓츠(Isaac Watts, 1674-1748)나 챨스 웨슬리(Chares Wesley,1707-1788)가 만든 찬송가들을 도입해서 예배에서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타협하지 못하고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19세기 초 남아프리카에서는 영국 출신의 두 주교 사이에서 모세5경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주교 로버트 그레이(Robert Bray,1809-1872)는 이 오경의 전통적인 연대기와 저자를 옹호했습니다. 이에 반해 나탈의 유명한 동료 존 윌리엄 콜렌소 주교(John William Colenso,1814-1883)가 연대기와 저자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콜렌소는 성경의 연대와 저자를 밝히는 새로운 학문적 성경 비평 방법인 출처 비평을 지지하는 『오경과 여호수아서, 비평적 찬사』(1866)를 비롯한 여러 성경 주석서의 저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전통적인 해석을 옹호하면서 영국 교회 내에서 논쟁과 분열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성공회 사제였던 사무엘 J. 스톤(Samuel John Stone, 1839-1900)이 모세오경의 무오설을 주장한 로버트 그레이 주교의 해석을 옹호하는 의미로1866년 “교회의 참된 터는(The Church’s One Foundation)” 이란 찬송을 써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윈저의 큐레이터였던 사무엘은 이 곡이 출판될 때는 옥스퍼드 레링턴의 가난한 마을 뉴윈저 교구의 젊은 성공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쓴 이유는 성경, 특히 바울 선생님이 교회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 가 중심이 되고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세워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1)” 이것에 근거하여 존 콜렌서 주교의 입장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을 기초로 해서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인 데니엘 포리스트( Daniel Ernest Forrest Jr, 1978-)가 찬송 안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듀크 체플을 re-opening 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기념으로 이 예배를 위해 커미션 된 음악입니다.
전체 네 개의 절에서 1절과 마지막 절을 같은 조성으로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게 합니다. 중간에 나타나는 2절과 3절은 각각 조성을 3음씩 상승 시켜가며 성악음악의 다양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곡안에서는 무엇보다 화려한 브라스와 오르간 앙상블의 반주가 돋보입니다.
이 안에서 나타내려 한 작곡자의 의도는 유니슨으로 찬양하며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조성을 바꾸어가며 찬양하는 가운데 다양성이 존중되고, 반주의 화려함과 웅장한 위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야 하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진하게 내포하게 하는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찰 담당자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그분만이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회의 모든 지체는 동등한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성 삼위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