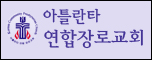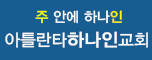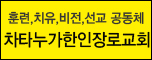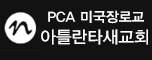연말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할로윈 데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10월의 마지막 날은 개신교의 생일이기도 하다.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부패에 맞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성단 문 앞에 게시한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1517년의 일이었으니 올해로 498주년이나 되었다.
루터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교회를 뒤집어 엎어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듯 하다. 그는 단지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시정되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는 신부요 학자로서 대중 선동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가 쓴 95개조의 반박문은 – 그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 라틴어로 쓴 글이다. 당시 라틴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다. 사제가 예배를 집례할 때나 귀족과 학자 층만이 읽고 쓸 수 있는 언어였다. 그의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 성당 문 앞에 쓰여진 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일개 신부가 쓴 대자보를 읽기 위해서 성당 문 앞으로 달려올 리도 만무한 일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신학사상이나 세계사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교회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루터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처단할 것인 가에만 골몰하였다.
이 얼마나 상식적인 말인가? 루터가 보통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하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아니라 신앙의 상식이었다. 교회는 그 기초적인 상식 앞에 천년의 세월이 넘게 공들여 세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였다.
종교 개혁 500년을 앞두고 이제는 개신교가 개혁을 요구 받고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적대감 앞에 서 있다. 미디어가 기독교에 적대적이라고, 정부가 개신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시정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교회가 불신자들의 생각, 곧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크나 큰 착각이다. 우리는 지금 의사의 입장에 있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무엇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받게 하였는가?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커녕 사회적 상식에서도 한참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웃은 없고 그저 내 몸 사랑만 남았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짜지도 못하고 밝지도 못하다.
세상은 교회에 거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교회가 그들이 믿는 그대로 행하는지 보고 싶을 뿐이다. 교회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지 복음의 상식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목사의 박사학위와 예배당의 크기, 신자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할 뿐이다. 교회의 직분에 따라 거들먹거리는 신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 앞에서도 겸손한 성도를 보기를 원한다.
교회를 향한 쓴 소리에 벌컥 화부터 내기 전에, 무슨 소린지 먼저 귀담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토론해야 한다. 입에 쓴 약을 사탄의 영적 공격이라고 아무데나 선전포고를 하고 다녀서는 안된다. 사탄의 계교는 언제나 달콤하고 유혹적이다. 절대로 뱉어버릴 만큼 쓰지도 않고, 거부할 만큼 양심을 흔들어 대지 않는다. 교회에 대한 쓴 소리는 세상을 통해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믿기에 세상사람들로부터 비상식적, 비과학적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몰상식이 신앙은 아니다. 복음은 상식이고 은혜는 기적이다. 오늘의 교회는 상식만 지켜도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