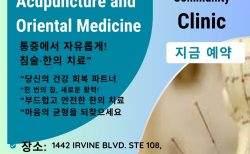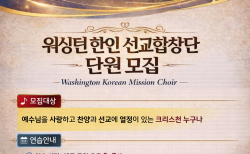마리아 플라센 교회당 위에 반짝이는 금환(金環)색 장식이 처마높이에 반짝이고
流層石 흘러내리는 황금 빛 레지덴츠 샘 광장 건너
모차르트의 세례 교회당에 사천 개의 파이프로 축조된 오르간을 상상해 본다.
비상한 인간지혜의 妙秘를, 차분한 마음으로
높디높은 평가로만 올려 세워 놓을 수도 없는 심정도 피어나오고,
나름대로 화려한 슬기 가지들을 흔들어 댈 수도 없는 마음 상태로
못 지은 結語가 엉거주춤히 흔들려지는 생각 사이에,
맞은편으로 건너질러
모세 상 바울 상 함께, 현관 위 정면에 우뚝 세워 놓은, 손안에 황금으로
반짝이는 상징 열쇠를 곧추세워 든 베드로 상,
파이프를 타고 흘러나오는 음색을 다듬는 교회당 대형 벽 흔들림에
경악을 숨 흘려 내면서, 머뭇거리는 만큼으로 번쩍이고 서있었다.
돌집으로 세워 놓은 회색, 백마, 갈색 마들의 마구간 말 행렬의 말발굽 소리
가슴 안으로 부디 쳐 와 쿠덕 쿠덕 머물고,
호헨 살쓰부르크 광장 앞에는 화폭처럼 높게, 성채를 타고 오를
언덕 기어오르듯 산기슭에 붙어, 외부 승강기 두 줄로 산 타 오르듯 솟구쳤는데
광장 한 가운데 아주, 대형 원형 동(銅)으로 세워진 球形構造物 위에는
작품 구도한 作家의 와이샤쓰바람 자화상 조각으로 하늘 향해 두 손 쳐들고 서서
성채 향해 올려다보고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유독이 끄네,
사각 맑게 깎은 靜雅한 화강암(花崗巖)
모차르트 음악대학교(UNIVERSITAT MOZARTEUM) 대형 유리현관 안에 들어서다
사방형의 홀 안 쪽, 왼편 조금 치우치게, 넓은 계단이 이층으로 향해
훤히 드려다 뵈는, 피아노 중심 한, 한 명씩의 각 樂器 개인교수 연습실이
검은 투명 유리창 안으로 비추이게 이. 삼층으로 올려 다 보이는데,
여기에서 음색 연구가들은 세계를 향하는 音樂 藝의 꿈을 다듬는다.
홀 한 쪽 벽, 하얀 현판에 세계적 유명 음악가들 중, 눈 익은 음악인들이
졸업생 그 명단에 올라, Paul Hindemith. Withelm Backhaus.
Herbert von Karajan. Paul Schilhawsky. Sandor Vegh. 낯설지가 않아,
인상 깊게 눈 안쪽으로 담아 놓고,
현관 곁에 두 사람 키만 한 사각 鐵製 의자가
가운데 앉는 곳을 마구 허물어뜨려, 내려 쳐져있게
鐵製 彫刻像으로 세워져 놓여 있어
무슨 상징일가 하고, 여러 상념을 가슴 안에 드리운다.
알맞게 부슬부슬, 지나치기에는 느낌 젖어지게, 빗방울 즐기면서
영광의 살쓰부르크여 안녕, 또 안녕
저녁 하이웨이를 시간 여, 깊은 상념에 젖어, 먼 산간 사이로 잦아드는
강한 노을빛 햇살 반짝임으로 한 가슴 가득 물들이며
밤늦게 발 닿은 마을이, 뮌헨 교외의 3층집 호텔 유리창 벽에 마주하는데,
여정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 아쉬워하면서, 침대 위에서 뒤 체이 듯
아침 햇살 눈부시게 창문가에 때린다.
커피 향을 입 안 가득 먹음을 가,
마로니에 잎, 커다란 잎줄기 선명하게 눈 안으로 차드는,
라일락 향기, 온 몸으로 덮쳐 오는 골목, 담장을 끼고 돌아
처음 뮌헨 비행장에 닿았을 때와는, 전혀 色感다른
르프탄자 비행기들, 떴다 내려드는 사이사이로
비행기 하나, 유에스 에어 안에 몸담는다.
비행기 유리창에 旅情의 몸무게 처져, 기우려
가득한 흰 구름, 눈 길 아래 연보라로 드리우는
깊은 나들이 꿈을 묻힌다.
젖어 드는 마음 기대는 사람과의 잔잔한 旅程 이야기,
침묵도 흐르고, 잔잔히 대화도 흐른다.
포근한 구름 빛 그 연보라의 피로_
지금은 하늘 가, 부 푸른 꿈 위에
머리 안엔 많아 진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하나씩 잠재우는 숨소리로..

이렇게 해서, 東歐의 짜릿한 旅程의 꿈 속 같은 세상 글 그림을 끝 맥임 합니다. 세상은 그리 간단하게 흑. 백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으로 훌 훌 나타나오는 세상은 결코 아닌 가 봅니다. 나이 들어서면, 몸도 여기 저기 아파오고, 그러니 그래 그냥 웃고 즐기고 떠들면서 살아가는 게 건강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 그저 떠들어대고 웃겨 젖히면서 살아가자고, 말하면서 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도 꽤나 병원 나들이를 하는 축에 든다고 보는 사람으로 볼 때, 거기 또 지난날의 생활이야, 말할 나위 없는 사람일 테지만, 나는 왠가 그런 생활방법에는 자꾸 속으로부터 거부감이 밀어 오르는 것이, 글쎄 내가 正常이 아닌 것인가, 여러 번 되풀이 해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한데 그래도 나는 '아니야..'라는 답이 혀 위에 자꾸 굴려 실려집니다. 인생은 끝나는 날까지 <(결국에야 안정되어져야 하기 위해서라도, 더구나 목회자의 생활에 젖어 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짓궂게라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기저기로 구겨져 가고 있는 이 世上 向한 '고민(苦悶)의 훈련(訓練)'은 그래도 자꾸 해 내가야 하겠다.>라는 답으로, 마음속에서 정답이 편안하게 박혀져 오고, 이래야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周邊 社會와 자신 안에 편안함을 만들어 내 가게 될 것이 라는 답으로 맘 잡혀집니다. 이것이, 여기 참으로 安靜 된 곳이라고 보여 지는 곳에 찾아 와 서서야, 저 아름다움의 音樂, 또 반짝거리는 예술藝의 美都에 와 서서, 더 내게 찾게 되는, 또 하나의 신앙의 眞價임을, 마음 깊숙이 다듬는 眞實로 또 그렇게 나 스스로 발견하는 마음자리가 되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