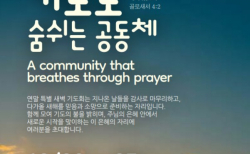난 일을 미루는 사람은 아니다. 무슨 일이건 서둘러서 탈을 낸 적은 더러 있었어도, 일을 미루어 두어서 잘못되었던 기억은 거의 없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숙제부터 했었다. 숙제를 마쳐 놓은 다음에야 밖에 나가 동무들과 놀곤 했었다.
해야 할 일을 꼭 마쳐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종종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녁에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늦게 까지 깨어있곤 한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기도회를 가지 못한다. 나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벽제단을 지키는 것보다 일이 우선할 수는 없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를 못한다. 5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 왔으니 쉽게 고쳐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는데,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일을 절대로 미루어 두지 못하는 내가 마냥 미루어두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하나 있다. 매해 성탄절 카드를 보내는 일이다. 지금껏 살아 오면서 성탄절 카드를 제때에 보냈던 기억은 거의 없다. 성탄절 카드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카드를 보낼 대상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순전히 내 악필탓이다.
난 글씨를 엄청 빠르게 쓴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을 쓰는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이어지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글로 적다보니 빠르게 쓸 수 밖에 없다. 빠르게 쓰는 글이니 글씨의 모양이 엉망일 것은 당연하다. 많은 경우에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읽지 못한다. 전후의 문맥을 살펴 그 글을 유추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 필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성탄절 카드의 안쪽에 한자 한자 꼬박꼬박 정성을 들여 축복의 글을 적어간다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글을 쓰는 것이 힘들어서 성탄절 카드를 구입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를 반복하다가 성탄절 문턱에 와 있곤 한다. 이 때 쯤이면, 이미 여러 장의 성탄절 카드가 내 앞으로 배달되어 있을 때이다.
어제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 왔더니 두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배달되어 있었다. 그 중의 한장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보내신 것이었다. 서예에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께서는 손수 붓을 들어 축복의 글을 적어 보내 주셨다. 興義라는 한자어를 적어 보내 주셨다. “김집사 內外분 기쁜 성탄 힘찬 새해 되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그 카드를 읽고 또 읽기를 거듭하면서, 내 악필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김군, 자네는 뭘 잔뜩 써 놓았는데 내가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 오죽했으면 대학시절에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을까? 이 글을 쓰면서, ‘목사님 제가 성탄절 카드를 못 보내 드리는 것은 순전히 제 악필 탓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바램도 같이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고 되풀이 해 온 바램을 언제나 이루어낼 수 있을런지…
김동욱 / 칼럼니스트
해야 할 일을 꼭 마쳐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종종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녁에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늦게 까지 깨어있곤 한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기도회를 가지 못한다. 나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벽제단을 지키는 것보다 일이 우선할 수는 없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를 못한다. 5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 왔으니 쉽게 고쳐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는데,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일을 절대로 미루어 두지 못하는 내가 마냥 미루어두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하나 있다. 매해 성탄절 카드를 보내는 일이다. 지금껏 살아 오면서 성탄절 카드를 제때에 보냈던 기억은 거의 없다. 성탄절 카드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카드를 보낼 대상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순전히 내 악필탓이다.
난 글씨를 엄청 빠르게 쓴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을 쓰는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이어지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글로 적다보니 빠르게 쓸 수 밖에 없다. 빠르게 쓰는 글이니 글씨의 모양이 엉망일 것은 당연하다. 많은 경우에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읽지 못한다. 전후의 문맥을 살펴 그 글을 유추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 필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성탄절 카드의 안쪽에 한자 한자 꼬박꼬박 정성을 들여 축복의 글을 적어간다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글을 쓰는 것이 힘들어서 성탄절 카드를 구입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를 반복하다가 성탄절 문턱에 와 있곤 한다. 이 때 쯤이면, 이미 여러 장의 성탄절 카드가 내 앞으로 배달되어 있을 때이다.
어제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 왔더니 두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배달되어 있었다. 그 중의 한장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보내신 것이었다. 서예에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께서는 손수 붓을 들어 축복의 글을 적어 보내 주셨다. 興義라는 한자어를 적어 보내 주셨다. “김집사 內外분 기쁜 성탄 힘찬 새해 되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그 카드를 읽고 또 읽기를 거듭하면서, 내 악필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김군, 자네는 뭘 잔뜩 써 놓았는데 내가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 오죽했으면 대학시절에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을까? 이 글을 쓰면서, ‘목사님 제가 성탄절 카드를 못 보내 드리는 것은 순전히 제 악필 탓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바램도 같이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고 되풀이 해 온 바램을 언제나 이루어낼 수 있을런지…
김동욱 / 칼럼니스트
 | |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