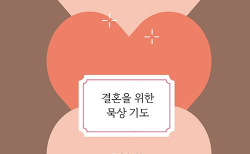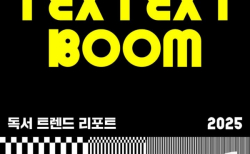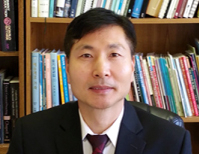[1] 어제 친한 신학교 교수와 통화를 했다. 그 교수는 평소 담임 목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지금이라도 좋은 목회지에서 청빙을 하면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그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주제는 항상 설교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설교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젊은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 교수가 꽤나 ‘늙은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2] 그러자 “젊은 설교는 어떤 설교를 말하는지요?”라고 물었다. “‘젊은 설교’란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다른 설교자와는 차별화되는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신박한 설교를 의미한다”라고 답했다.
과거엔 들어보지도 못한 말 중에 ‘신박한’이란 단어가 요즘 자주 들린다. 주로 신발이나 옷과 같은 상품을 얘기할 때 그 용어를 쓴다.
[3] ‘신박한’이란 말은 ‘새롭고 놀라운’ 혹은 ‘참신한’ ‘기발한’이란 뜻의 신조어이다. ‘Wow!’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는 내용이나 발상을 의미한다. 영어로 ‘Think outside the box’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라’는 뜻이다. ‘innovative’ 또는 ‘creative’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unique’, ‘novel’, ‘fresh’, ‘surprising’이라는 용어도 활용 가능하다.
[4] 우리의 설교도 이렇게 해야 통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다. 그의 시에 반한 독자들이 많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그의 시는 정말 짧다. 길어봤자 두세 글자이다. 예를 들면,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이게 그가 쓴 시 한 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를 쓰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만 봐선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5] 하상욱 시인이 쓴 시에 많은 독자들이 어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시가 귀납적이라는 점이다. ‘귀납적’(Inductive)이란 말이 뭘까? 그의 시가 처음엔 궁금증을 유발했다가 나중에 ‘아하!’하고 깨닫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소개한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이란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 이 짧은 시를 읽은 독자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6] 그런데 바로 밑에 정답이 있다. ‘시의 제목’ 말이다. 정답은 ‘다 쓴 치약’이었다. 이 단어를 본 독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행복해한다.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치약을 다 쓴 거 같아서 버리기 전에 아까워서 계속해서 끝을 짜서 사용한다. 그런데 그 속에 무슨 놈의 치약이 그리도 많이 들었는지, 짜도 짜도 계속 나온다. 나중엔 귀찮아서 버리고 새 치약을 사용한다.
[7] 한 번은 인터넷에 보니 새로운 작품이 하나 나와 있었다. 내용은 ‘읽고는 있는데’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목을 봤더니, ‘레위기’였다. 순간 ‘포복졸도’(抱腹絶倒) 했다. 그뿐 아니라 하상욱 시인이 더 좋아졌다. 알고 보니 그도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읽으면 하품이 나오고 따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읽고는 있는데’라 썼다. 다들 한두 번의 경험을 갖고 있다.
[8] 거기에다가 궁금증을 유발한 후 답을 읽게 한다. 이 방식이라야 통한다. 보통 수필이나 시나 소설은 제목이 먼저 나온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통하려면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제목부터 나오지 않고, 내용부터 쓴 후 나중에 어떤 제목인지 확인하게 한다. 그렇다.
이게 바로 ‘신박한’ 방식이다.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로 신박해야 통한다.
[9] 다른 설교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하는 설교엔 청중이 주목하지 않는다. 청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설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야 한다. 그래서 내가 쓴 설교학 책이나 내가 가르치는 설교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한 번은 헌신 예배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교회의 사무원이 전화가 왔다. 설교 제목을 주보에 실어야 하니 본문과 제목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었다.
[10] 설교 제목이 없으니 비워두라고 했다. 농담으로 여긴 사무원이 빨리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하는 수 없이 제목을 알려주었다. 그때 있는 그대로 적으라며 알려준 제목은 ‘?’였다. 술직히 주보에 설교 제목이 없으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충격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상욱 시인의 방식처럼 설교를 마칠 때까지 제목을 보류하는 식으로 시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내가 창안한 방식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11] 최근에 내가 구상한 설교의 제목 하나를 소개해 보자.
‘그 왔 빛 없, 그 떠 어 없’(요 1:9)
이 제목을 보고 설교의 내용을 감 잡거나 눈치챌 성도는 없다. 궁금증을 유발하고, 애를 태우는 설교의 제목이 틀림없다.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설교일까?’라며 기대를 갖고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다.
[12] 설교 끝에 가서 감동적인 예화와 함께 궁금했던 설교의 제목을 풀어준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바로 이 내용인데, 과거 자신의 시신을 담을 관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난 편도 선교사(One way missionary) 한 사람이 죽고 나서 아프리카 주민들이 세운 묘비명이다.
[12] ‘그 왔 빛 없, 그 떠 어 없’(요 1:9)
우리 주님의 묘비명이 있다면 가장 적절한 문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내 묘비명에도 이 두 문장을 적어주면 좋겠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