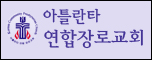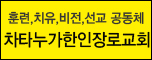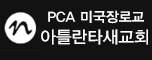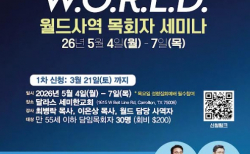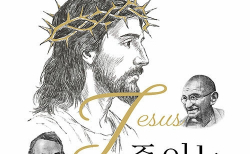읽는 것치고 남는 것 없기로는 자서전만한 것이 없다. 현대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것 같다. 돈 많은 영웅, 정치하는 영웅, 인기 많은 영웅 이야기뿐이다. 책 제목은 그럴싸 한데 내용은 거기서 거기다. 인생을 꾸며낼 수 있는 글은 많지만 삶을 담아내는 글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아흔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흔 일곱 된 할머니의 농사 얘기, 자식 생각이 전부인 책이다. 하지만 꾸밈없는 글이기에 방어할 틈도 없이 마음에 꽂히고, 평범하기에 더욱 살갑다.
이 책을 쓴 이옥남 할머니는 1922년 양양 갈천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여자는 길쌈을 잘해야 한다며 일곱 살 때부터 삼 삼는 법을 배우고 아홉 살 때 호미를 잡았다. 아홉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의 구박을 받았다. 훗날 생각해보면, 새어머니도 먼저 있던 자식을 떼어 놓고 새로 시집왔으니 얼마나 가슴에 맺혀서 그랬겠냐고 한다. 열일곱에 시집을 왔으나, 예전 누구나 그랬듯이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서 자식들을 키우며, 늙어서는 자식, 손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할머니는 여자가 글 배우면 안된다는 아버지 밑에서 몰래 오빠 등 너머로 글자를 익혔지만, 시부모, 남편 살아 있을 때는 아는 체를 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리고 남편,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느 날 도라지 팔아서 산 공책으로 그저 글씨 좀 이쁘게 써 볼까 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30년이 넘었다. 이 책은 그 30년간의 글자 연습의 결과다.
책에는 사계절 속에 할머니의 일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봄에는 투둑새(비둘기) 소리에 마음 설레지만 농사지을 때를 놓칠까 바쁘고, 여름에는 멍석떼처럼 일어나는 풀 때문에 김매기도 해야 되고 밭에다 콩 심고 깨 심고, 도라지도 캐야 한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사람이 그립고 마음이 허전하다. 가을에 내리는 비가 야속해 ‘사람이라면 고만 오라고나 하지’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겨울나기를 하는 짐승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걱정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할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 타지로 떠난 자식들이 늘 그립다. 자식은 떠나 온 고향이 그립지만, 어머니는 늘 자식을 생각한다. 목 매여 기다리던 막내 아들이 정작 와서는 친구 만난다고 훌쩍 나가니 서운하다.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받으면 그것이 한없이 미안하고 고맙다.
농사 짓거나 산에서 뜯은 나물을 팔다가 너무 값을 깎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팔십 넘어서 남에게 ‘사시요’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다. 만 오천 원은 받을 수 있었던 삼태미(삼태기:재나 두엄을 퍼담아 나르는데 쓰는 용구)를 칠천원에 팔고 마음 아파 계속 생각을 한다. 마을 총회에 희사금을 이만 원이나 냈는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총무가 그걸 말해 주지 않아서 쓸데없이 돈 썼다고 후회하는 이야기도 있다.
나이 들어 사람이 그립고, 친구들이 먼저 떠나는 것이 늘 눈에 밟히면서도 싫은 사람은 또 확실하게 싫다. 이해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제 욕심만으로 꽉 찬 ‘방오달’이 자식들이 먼데 사니까 만만하게 본다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혼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늘 싫은 소리를 해대는 말 많은 세빠또 할머니가 꼴보기 싫다고 말한다. 세빠또 할머니에 대해서 ‘언제 봐도 반갑지 않고 아무리 오래 있다 봐도 반갑지 않고 곁에 있기도 싫다’고 하는 글에서 이보다 명쾌하게 싫은 사람에 대해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옥남 할머니가 지내온 아흔 일곱 번의 계절을 함께 읽으며 잊어버렸던 흙냄새를 떠올렸다. 억지로 하는 인간 관계의 역겨움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 냄새도 맡게 되었다. 투덜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도 했다. 우리가 보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누구를,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그 계절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