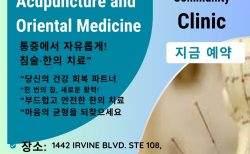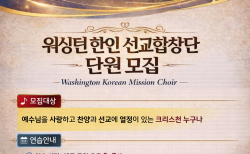흔히들 이런 표현을 쓰곤 한다. “바다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막함 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떠올린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실제 그 감정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바다 위에 홀로 떠 있어 본 경험이 없다면.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제작해 화제가 된 영화 <언브로큰>은 지난해 고인이 된 실제 인물, 루이 잠페리니(잭 오코넬 분)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는 19세에 최연소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가 되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의 주목을 받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공군에 입대한다. 영화는 이후 그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그 어려움의 강도와 세기가 극적 요소의 핵심이다.

바로 서두에 언급한 ‘바다 위 표류’가 그것들 중 하나다. 그것도 47일 씩이나. 물론 루이 혼자만은 아니었고 두 명의 동료가 더 있었다. 그럼에도 작은 고무보트 두 개에 의지해 태평양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심리를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해가 진 후의 암흑은 스크린 밖으로까지 공포를 전달한다.
이것만으로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극한, 그 중에서도 매우 혹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루이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생의 끈을 겨우 붙들고 있을 때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구원’의 손길은, 단지 그들의 목숨만을 건진 뒤 사라지고, 다시 그들 앞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운다. 47일의 표류 끝에 만난 것이 하필이면 일본 군함, 곧 그들의 적이었던 것.
<언브로큰>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루이의 이야기는 이미 책으로도 출판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에서 이야기 자체의 전개보다 그 안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관객들 역시 시종일관 몰아붙이는 시련 앞에서 ‘과연 나라면…’ 하고 한 번쯤 물음을 던질지 모른다. 또한 스스로 루이가 되어 볼 수도 있다. 영화는 루이가 자라온 환경, 그의 가족과 신앙 등을 초반에 그리며 그 같은 ‘감정이입’을 돕는다.
그런 과정을 숨죽여 이어가다 보면 어느 새 영화의 결말에 이른다. 결말의 모양이 어떻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 제목처럼 이미 분명하다.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버린 채 좌절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부서지지 말라’가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다’일지도 모르겠다. 견디는 삶의 위대함 말이다.
한편으론 식상할 수 있으나, 그런 교훈이 ‘실화’ 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통이란 무엇인가’ 등 나름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영화가 주는 감동과 유익은 크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종류와 유무를 떠나, 루이와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에 비례해 감동 역시 커지리라. 다행히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산다. 그것이 꼭 물리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바다에 던져진 것 같고, 무언가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인생, 어쩌면 그것이 시대의 중요한 한 단면이 아닐까. 바로 이 영화가 갖는 또 다른 의미의 ‘대중성’이다.

루이 잠페리니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영화 속 이야기는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 전의 것이다. 영화를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는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무엇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 중 하나가 긴 여운으로 남아 있다. ‘용서’에 대한 것인데,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길. 특히나 기독교인이라면.
아울러 이 영화는 ‘휴먼스토리’면서도 ‘블록버스터’를 표방하고 있다. 처음엔 의아했으나, 관람 후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그 만큼 시각적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재미를 주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