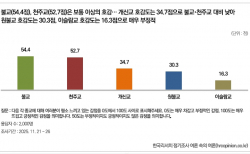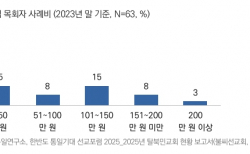(시애틀 AP=연합뉴스) 뉴욕시에서 통계 관련 일을 하는 저스틴 바세트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에 응했을때 그는 경력에 관한 통상적인 질문을 예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면접담당자는 페이스북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물었다. 베세트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알려고 하는 회사를 위해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과 함께 취업 신청을 철회했다.
미국내 취업시장이 점차 좋아지면서 바세트와 같은 질문을 받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일부 기업과 정부기관들은 구직자의 신상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히 소셜 네트워킹의 프로필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용자 로그인(접속)을 요구한다.
연방검사를 지낸 조지워싱턴대학 오린 커 법학교수는 이에 대해 "지독한 사생활 위반이며 집 열쇠를 요구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비난했다.
구직자에게 소셜 네트워킹 로그인을 요구하는 관행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공공기관이 로그인 요구를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소셜 네트워킹의 등장으로 취업담당자가 입사 지원자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트위터의 계정을 참고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비롯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의 많은 이용자들은 프로필을 비공개로 하거나 선택된 사람만 볼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직자의 패스워드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들은 인력담당 매니저를 소셜네트웍상의 '친구' 명단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입사후 사용자에 관한 부정적 얘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받기도 한다.
경찰관이나 911구조대원 같은 공공기관 일자리는 입사 지원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리노이주 맥린 카운티의 경우 2006년 이후 치안담당 부서의 구직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에 대한 검사를 허용한다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러스티 토머스 보안관대리는 "구직자가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스포트실배니어 카운티 치안담당 부서도 911 구조대원이나 경찰 구직자에 대해 친구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하비 팀장은 "구직희망자의 신상을 알기 위해 과거에는 친구나 이웃과 얘기했지만 이들이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인적 교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사이버상의 친구가 이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스크린 하는 것은 기관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는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구직 가이드'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챈들리 브라이언은 "구직자는 항상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는지 알아야 하며 누군가 그 사이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