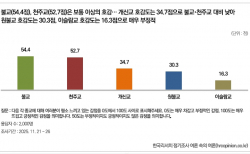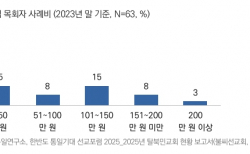(뉴욕=연합뉴스)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거주지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소재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맨해튼연구소의 `흑백분리 세기의 종언 :1890-2010 미국사회의 인종분리' 보고서를 인용,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 분리 현상이 1910년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31일 보도했다.
50년 전에는 흑인의 50%가 빈민가(ghetto)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20%로 줄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100% 백인만 모여 사는 동네는 사실상 사라졌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 저자인 에드워드 글래서 하버드대 교수와 제이콥 빅도르 듀크대 교수가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전국 658개 거주지 가운데 1곳만 제외하고는 모두 1970년대에 비해 흑백분리 현상이 낮아졌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658곳 중 522곳에서 흑백분리 현상이 완화됐다.
이같은 현상은 디트로이트와 같은 산업도시를 떠나는 흑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통적으로 흑인이 많이 사는 남부 선벨트 지역의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흑인들의 지속적인 이주와 도시 근교의 재개발 사업으로 흑인들만 살던 빈민촌이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는 전례없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시골에 살던 흑인들이 1910년대부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한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정책과 모기지 대출 등에서의 차별적 관행으로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같은 현상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이후 차별정책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이 제정되면서 거주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던 정책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도시 근교에는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흑인들이 꾸준히 몰려들었고 지금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모습을 하게 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 완전한 통합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있다. 존 로간 브라운대 교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흑백분리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속도를 보면 아직도 상당기간 분리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