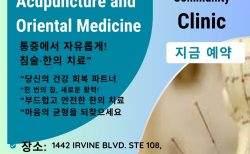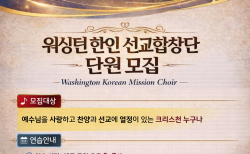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서울=연합뉴스) 미국 뉴욕 등 대도시에서 영어가 서툰 이민자 사업가들이 통신·교통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국제판인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10일 한국인 김기철 씨 등 이민자 사업가들을 소개하며 언어장벽이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30년 전 미국 뉴욕에 이민 온 김기철(59) 씨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매업체를 크게 키운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으로 통한다. 김씨가 처음 뉴욕 브루클린에 옷가게를 열었을 때 고객 대부분은 흑인이었다. 그는 "고객과 꼭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었다"며 "손짓 발짓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의 리더인 김씨는 개인 사업체의 성장뿐 아니라 한국 이민자 사회의 미국 내 영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는 "내 인생에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IHT는 김씨와 같이 성공한 사업가들은 대부분 출신 지역의 이민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영어를 못해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뉴욕에서는 한국, 중국, 히스패닉계 사업가들이 탄탄한 이민자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역 이민자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나서 발달한 통신, 교통, 상거래 기술을 이용해 미국 내 또 다른 이민자 밀집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순서를 밟는다.
멕시코 출신 펠릭스 산체스 드 라 베가 구스만(66) 씨는 길거리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인 또띠야를 팔다가 이를 연매출 1천900만 달러의 식품제조업체로 발전시켰다. 그의 사업체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피츠버그 등 미국 곳곳의 멕시코 이민자들을 공략한 데 이어 멕시코 본토에까지 진출했다. 40년 전 뉴욕에 이민 온 구스만 씨 역시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
영어에 서툰 이민자 사업가들은 대부분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의존해 업무를 본다. 뉴욕에서 연매출 3천만 달러에 직원 45명을 거느린 휴대전화 액세서리 사업체 운영하는 장위룽(39) 씨는 거의 중국어만을 사용한다. 장씨의 직원들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으로 거래처와 소통한다. 장 씨는 "(사업을 운영할 때) 유일한 장애물은 내가 너무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가장 450만명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만5천500명의 가계소득은 연간 20만 달러가 넘는다.
뉴욕시립대 사회학과의 낸시 포너 교수는 "영어가 서툰 이민자 사업가들의 능력 확장에 기술이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이들은 기술을 이용해 회사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