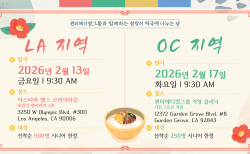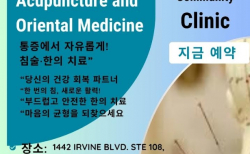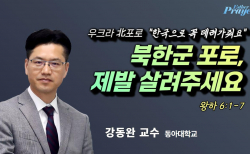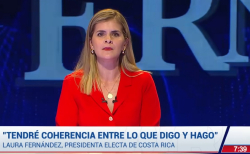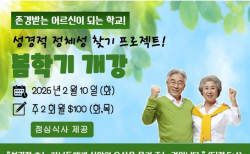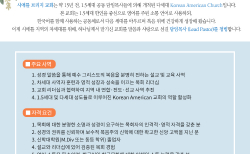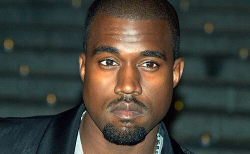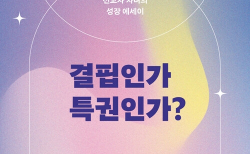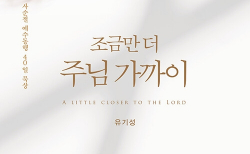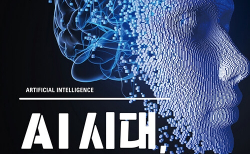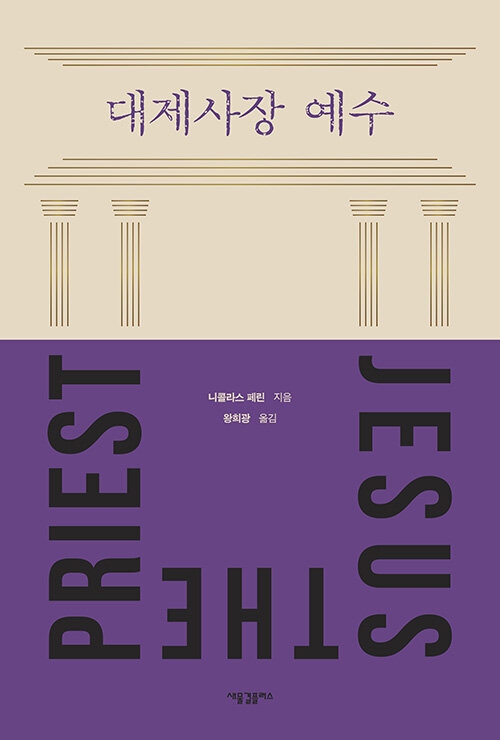
니콜라스 페린의 탁월한 예수 연구 삼부작 중 두 번째 책인 <대제사장 예수>가 국내에 소개된다. 앞서 출간된 <예수와 성전>과 더불어, 페린은 고대 유대교 문헌과 성경 본문에 대한 방대한 주해를 바탕으로, 예수의 자기 인식과 사역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적 대담함을 선보인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예수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자기 이해에 따라 공생애의 모든 순간을 살아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다.
<대제사장 예수>는 신약성서뿐 아니라, 구약성서, 제2성전기 문헌, 후기 유대교 문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대 자료들을 종합하며, 복음서 내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뤄졌던 예수의 제사장적 정체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개신교 신학계에서 다소 소외되어온 이 주제에 대해, 페린은 신학적·역사적·문헌학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접근하며, 예수의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로운 틀 안에서 재조명한다.
예수의 기도에서 싹트는 제사장직
책의 첫 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페린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요약한 제사장적 선언문이라고 주장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 구절부터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예수의 제사장직이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 실천으로 요청되는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례, 고난, 인자 - 제사장의 길을 걷다
2장과 3장에서는 예수의 세례와 고난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이해했는지를 분석한다. 페린은 예수의 세례를 단순한 공생애의 출발이 아니라, 성소 재건의 시작으로 해석한다. 이는 다윗 왕가와 솔로몬이 이끌던 제의적 리더십과도 연결되며, 예수가 세례의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받고, 동시에 성전을 새롭게 성별하는 자로 자각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특히, 예수의 "인자" 호칭에 주목한 부분은 본서의 독보적인 특징 중 하나다. 다니엘 7장의 인물을 단순한 종말론적 인물로 보지 않고, 제사장적 사명을 지닌 내러티브의 중심으로 읽어내는 이 작업은 예수의 사역이 제사장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해석을 강화한다.
다윗의 자손, 인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페린은 예수의 다양한 호칭인 다윗의 자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단순한 메시아적 칭호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전 지향적이며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체성으로 통합해 해석한다. 제2성전기 유대교가 꿈꾸었던 메시아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성전의 재건과 제사장 제도의 회복이었다는 맥락에서, 예수는 바로 이 기대를 성취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본서는 예수의 공생애, 기도, 가르침, 세례, 마지막 논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통하는 제사장적 구조를 통찰하며, "예수는 말 그대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강렬한 결론을 내린다.
복음서의 '공백'을 메우는 창조적 작업
기존 개신교 학계는 복음서 내에서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한 후속적 신학 체계로만 다뤄왔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는 이 공백을 메우려는 학문적 시도이자, 예수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전장이다.
나아가 본서는 예수의 속죄 사역과의 관계를 후속작 <희생제물 예수>를 통해 확장시킬 예정이다. 속죄와 대제사장직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예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본래 의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주류 신학과 정치신학 사이, 균형의 모색
페린의 작업은 단지 신학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복음서 내에서 제사장적 내러티브를 재발견함으로써, 정치신학으로만 예수의 사역을 축소하려는 흐름에 대한 경계를 제시하고 있다.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단순한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정치주의적 성향에 반해, 그는 신성한 공간, 종말론적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라는 제사장적 패러다임을 통해 균형을 되찾고자 한다.
"우리는 누구의 제사장직 아래 살고 있는가?"
<대제사장 예수>는 단순히 학문적 독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예수를 따르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제사장직 아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예수의 기도와 고난, 제자도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의 길을 따르도록 초대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오늘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던지는 시대적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