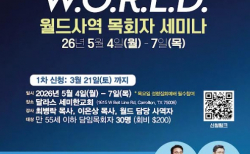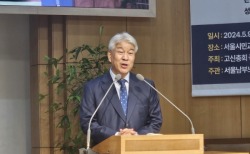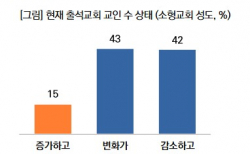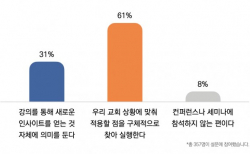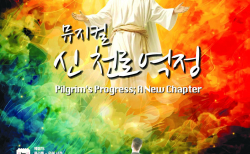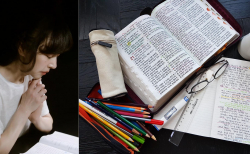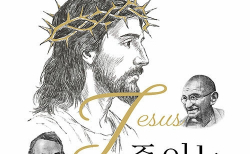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흔히 직업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과연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일까? 2002년 리젠트 칼리지에서 저자 故 고든 피 교수(1934~2022)는 그리스도인의 '소명, 일, 사역'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탐구하는 네 번의 연속 강연을 했다. 그의 목표는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그들의 '풀타임' 사역을 위해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으로 준비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저명한 바울 서신의 문맥과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명한다. 나아가 '소명'은 직업 또는 교회 사역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일상 속에서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일으키는 사명임을 일깨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소명을 '직업'으로 여기는 세상의 해석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더 온전하고 성경적인 이해로 이동해야 한다. 성경적 부르심 개념은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유사한 대응 개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오늘날도 확실히 그러하다. 하지만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복음주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소명적 사역, 또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르심의 개념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는 순간, 우리 세대의 교회가 만들어 낸 엄청난 수의 정신분열증 환자를 또 만들어 내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늘 불안해하고,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고 했다.
이어 "바울은 주로 가부장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그를 향한 지침은 아내를 향한 것보다 네 배나 길다. 반면에 다른 두 관계에서는 가부장의 지침이 다른 사람들(즉, 자녀와 노예)에 대한 지침의 절반에 불과하다. 각각의 경우 바울의 관심사는 가부장권을 소유한 남편, 아버지, 주인인 가부장이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가정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십자가적인 삶을 사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은 일을 거부했을까? 전통적인 답변은 그들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거의 잘못된 생각이 확실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솔직히, 본문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탁토이'한 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 자신들의 입장을 취했다는 증거는 없다. 내 직감으로는 그들의 태도가 일에 대한 특권적(그리고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모든 허드렛일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특권층이 육체노동에서 면제되는 문화 속에서, 이러한 태도는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졌을 법하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로마서 12:6-8에서 바울은 은사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며,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각 부분은 몸에 필수적이며, 이는 교회가 '교역자'와 '평신도'라는 용어로 나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역'(ministry)을 목회자가 하는 일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역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사들이 풍성하고 다채롭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했다.